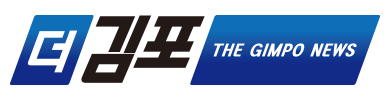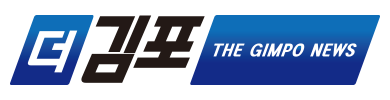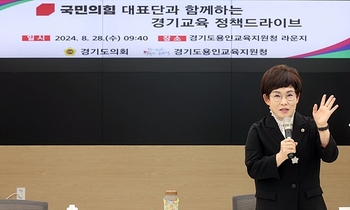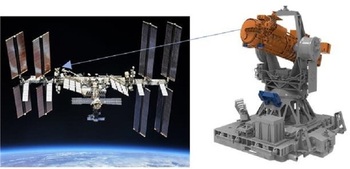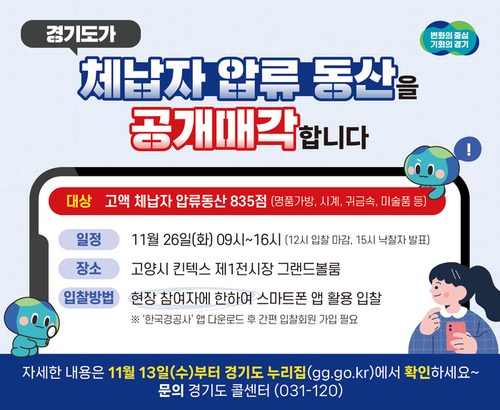|
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수탉의 힘찬 울음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. 특히 시계라고는 변변한 것 하나 없는 시골에서는 수탉의 첫 울음소리는 잠들어 있던 모든 생명을 깨우고 활기차게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. 시계가 없던 때라 닭울음으로 시간을 알았는데 일명계, 이명계, 삼명계로 부르는 닭이 있어 이 닭들은 저마다 자시와 축시와 인시에 정확하게 울어 시간을 알렸다고 한다. 이와 같이 수천 년 동안 우리 겨레는 닭 울음으로 새날을 맞이했던 것이다. 닭은 어둠을 쫓는 전령사요, 광명을 알리는 예언자로 우리 겨레의 토속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영물이었다. 본인은 어릴 적부터 닭 기르기를 무척 좋아했다. 초등학교 1-2학년 정도로 기억되는 시절, 고향 시장 장날 어머니에게 닭을 사달라고 조르고 졸라 두 손에 당당히(?) 중간 크기 정도의 닭을 손에 들고 집으로 향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. 지금 생각해 보면 경제라는 개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중간닭을 길러 알을 잘 품게 하여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를 길러보고 싶은 욕망이 너무도 컸었던 것 같다. 지금은 보기도 쉽지 않은 토종닭 두 마리를 아침, 저녁으로 정성스레 보살핀 때문인지 몰라도 두 마리의 닭으로 많은 병아리를 길러 ,그 병아리가 다시 닭이 되었을 쯤에는 집에는 달걀이 떨어질 날이 없었다. 그 당시에는 달걀이 매우 비싸고 귀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닭이 알을 낳기가 무섭게 동생들과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닭장에서 꺼내와 서로가 들키기나 할세라 먹어 치우곤 했다. 토종닭은 본디 체구가 작고 그 때문에 계란의 크기도 매우 작은 편이다. 현재 토종닭은 고려닭, 청리닭, 구엄닭, 현인닭 등등 몇 종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이다. 얼마 전 옛날 추억에 사로 잡혀 토종닭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마침 김포장과 강화장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부푼 가슴을 않고 발걸음을 급히 시장으로 향했다. 그런데 그 부풀었던 마음도 잠시 가슴 깊이 실망감이 썰물같이 밀려왔다. 장에 팔려고 나와 있는 토종닭들은 내가 옛날에 보던 토종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해 감히 토종닭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. 한참을 시장을 돌아다닌 뒤 돌아오는 발걸음 한걸음 한걸음에서 그동안 흘러온 세월을 느끼는 것 같아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거웠다. <저작권자 ⓒ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댓글
|